덧없이 떠도는 想念
- ‘하늘과 바다 사이’ 찻집에서
- 배주선
하늘과 바다 사이
허공虛空
남색 치마 풀 먹여 펼친 하늘에
백저포白苧布 몇 점 노 젓고
갯바위에 대를 띄운, 몇 사내
오히려 한가롭다
*
옛날 옛적 가난한 어부가 황금고기를 낚았네
용궁의 왕자였네 살려달라 애걸복걸했네
마음씨 좋은 어부 놓아줬네
심술머리 사나운 마누라 부자 될걸 놓쳤다고 야단이네
어부는 금고기를 찾아갔네
그날부터 날마다 성찬이네
욕심 많은 마누라 집이 게딱지라고 심통 부리네
어부는 금고기를 찾아갔네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 하인들도 거느리게 됐네
팔자 펴진 마누라 왕비가 되고 싶다고 앙탈이네
큰일 났네 마누라 왕비 되려면 어부가 임금이 되어야 하는데
어부는 금고기를 찾아갔네
금고기는 슬픈 표정으로 말없이 물속으로 들어갔네
고래등 기와집 간데없고 게딱지 초가에
누더기에 앞가림한 여자가 훌쩍이고 있었네
어부는 덩실덩실 춤을 췄네
*
사내가 소리쳤다
팔뚝보다 굵은 황금색 열갱이
갯바위에서 뛰고 있다
하늘 한번 쳐다보고
바다 한번 내려다보고
허공虛空
* ‘하늘과 바다 사이’ 찻집 : 양양군 인구 해변
* 열갱이 : 연어과의 민물고기인 ‘곤들매기’의 방언. 누런 색깔에 배에 흰 무늬가 있다.
- 시집, <허공, 하늘과 바다 사이>(모던포엠, 2021)
* 감상 : 배주선(裵宙璿) 시인.

1940년 경북 안동 일직면에서 태어났으며 강원도 강릉에서 살았습니다. 경향신문사 부국장, 강원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02년 퇴임하였습니다. 2013년 종합문예지 <월간 모던포엠>에 ‘아침 창가에서’ ‘고향 나그네’ ‘첫눈 오는 밤’ ‘세모의 거리에서’ 등이 신인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늦깎이 시인으로 시단에 나왔습니다. 등단 후, 모던 포엠 동인으로 활동하는 등 강원지역에서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1년 첫 시집 <허공, 하늘과 바다 사이>(모던포엠, 2021)를 냈습니다. 현재는 동인지 ‘현대시문(現代詩文)’을 발간하는 강원현대시문학회 회장, 월간 <모던포엠> 상임이사, 그리고 경주배씨대종회 흥해파종회(興海派宗會)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8월 말 정년퇴직을 한 후 저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경주배씨대종회(慶州裵氏大宗會)’ 사무실에 나가 종보(宗報)를 발간하는 책임을 지는 편집국장으로서 일손을 거들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발간되는 종보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종친들의 소식과 대종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기사화하여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하는 매체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같은 성씨의 많은 종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사(宗事)에 관심을 가지는 때가 아무래도 지긋한 나이가 되어야하므로 관련된 분들은 대부분 칠, 팔순은 훨씬 넘긴 어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이번에 저와 함께 일을 시작한 신임 사무국장께서 사무실 창고 공간을 청소했다면서 버려야 할 여러 잡동사니를 내놓았는데, 그중에 책 한 권이 특별히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사한 고급 양장본으로 된 작은 책은 뜻밖에도 ‘시집(詩集)’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지 첫 페이지에 ‘東舟 裵宙璿(동주 배주선) 謹呈’이라는 고무인이 찍혀 있는 걸로 봐선, 종친 중 어느 시인께서 대종회 사무실에 보내왔으나, 조상을 섬기는 제향일(祭享日) 날짜가 종보에 잘못 인쇄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하는 이곳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찮은 시집’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손을 댄 흔적이 없는 시집 꾸러미를 한쪽으로 옮겨 따로 보관해 놓으면서 시간 날 때 읽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그중 한 권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을 이용해서 시집을 펼쳤는데, 마지막 페이지까지 쉬지 않고 내리 단숨에 읽어 내려가면서 알지 못하는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마치 그의 시(굴렁쇠)에서 표현한 것처럼 ‘아침 나들이 / 마을 길에서 생 낯의 여인’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팔순을 훨씬 넘긴 노(老)시인이 살아 온 의로운 삶의 여정이 생생하게 느껴져 왔습니다.
오늘 감상하는 시는 시인이 즐겨 찾는 강원도 양양군 인구 해변에 있는 ‘하늘과 바다 사이’라는 이름의 카페에 앉아 바닷가에서 낚시하고 있는 낚싯꾼과 푸른 바다, 그리고 맑은 하늘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상념에 잠겨, 그것을 소재로 삼아 자신이 살아온 팔십 인생을 마치 드라마 한 편을 감상하듯이 기발한 ‘시적 은유’로 담담하게 풀어낸 시입니다.
열심히 낚싯줄을 드리워 열갱이를 잡았다고 큰소리치는 ‘사내’가 어쩌면 평생 황금 물고기를 찾아 절치부심했던 어부였던 시인 자신이었다고 겸허하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도끼를 웅덩이에 빠뜨려 잃어버린 나뭇꾼이 물가에서 울고 있을 때마다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를 줬다는 옛이야기가 생각나게 하는 ‘시적 은유’는 참으로 정겹게 다가옵니다. 아내의 성화가 있을 때마다 ‘금고기를 찾아갔다’는 어부의 항변은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욕심 많은’, ‘심술머리 사나운 마누라’의 욕심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인데, 오히려 매번 금도끼를 돌려주던 금고기가 마지막에는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아무 기별이 없자 ‘고래등 기와집 간데없고 게딱지 초가에 / 누더기에 앞가림한 여자가 훌쩍이고 있었’고 그제야 ‘어부는 덩실덩실 춤을 췄네’라는 표현에 이르러서는 슬프면서도 벅찬 응원의 박수를 맘껏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시집은 4부로 구성되어 80여 편의 시들이 실려 있는데 각 부가 시작되는 속 표지에는 시인이 직접 그린 유화 그림이 삽화로 실려 있었습니다. 틈틈이 배운 그림 실력이 경지에까지 오른 느낌입니다. 시집에 실린 주옥같은 시편 중에서 ‘종지기 소년’이라는 제목의 시는, 그의 이런 삶의 내공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어렴풋이 보여주는 시인 듯하여 특별히 소개해 봅니다.
종지기 소년
- 배주선
소년은, 그해 겨울 종지기였습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에이는 눈보라에도
한겨울 종을 울렸습니다
겨울방학은 막 시작되었습니다
종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새벽 네 시
날마다 이 새벽에 누굴까
게으른 겨울밤이 깨려면 아직도 까마득입니다
용수철처럼 이불속에서 튕겨져 나와
얼음으로 먹칠한 어둠의 언덕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끼 낀 청기와 예배당은 언덕에 있었습니다
잡티 하나 없는 순 은색
교회에 오직 한 분 어른이신
장로님이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내일부터 네가 종을 치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밤 머리맡에
자명종을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참 행복했습니다
어른이 되어 물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올렸나”
소년은 이제 대답합니다
소년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해 종을 울렸습니다”
소년은
지금도 듣습니다. 그 종소리
사랑과 평화의 기도를
- 시집, <허공, 하늘과 바다 사이>(모던포엠, 2021)
이 시에도 앞서 감상했던 시처럼, 금방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시적 은유’로 옛이야기 하나를 시 속에 슬쩍 숨겨놓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옛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입니다.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 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소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처럼, 시인은 그 첫 헌신으로 교회의 종지기가 되었고,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그 일을 완수했던 ‘그해 겨울은 참 행복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친절하게도 시를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의 시적 은유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렸나’는 자문(自問)을 헤밍웨이의 장편소설 제목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이 된 그 ‘소년’은 지금 여기서 자답(自答)합니다. ‘나를 위해 종을 울렸습니다 // 소년은 / 지금도 듣습니다. 그 종소리 / 사랑과 평화의 기도를’
탄탄한 내공이 쌓인 그의 시편들을 읽어 내려가다가, '진짜'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선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노(老) '소년'의 목소리는 겸양과 부드러운 여유가 흘러넘쳤습니다. “보잘것없는 졸작을 두고 칭찬을 해주니 감사하다. 행복을 돈처럼 은행에 저축해 두었다가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다면 좋겠다. 시를 읽는 이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대관령을 넘나들면서 한 마리 새가 되어 ‘바람이 지나가며 하는 말 한마디’조차도 놓칠세라 귀 기울이는 시인의 시 노트에 있는 한편을 더 감상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모, 대관령에 서다
- 배주선
바람은 쉬지 않는다
다사다난多事多難, 저문 언덕에 서면
언제나 그랬다
시렁에 던져둔 노트, 오늘
먼지를 털었더니 쏟아지는 잡동사니
저문 해를 다독이는 선명한 흔적들
지금은 마음의 지도가 뚜렷해지는 시간
싸르륵 화석 긁는 눈바람을 뼛속까지 삼키며
나는 묻는다 정녕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정녕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였나
정녕, 그리고 또, ......
한 점 바람이 지나며
먼저 너와 네가 동화同和하란다
눈벌에 우윳빛깔 맨살로
두 팔 하늘로 날려 늘어선 자작나무들
겨울 숲 위를 한 마리 새가 날아가고 있다
나는 지금 미동도 없이
행여 놓칠세라
그, 새를 지켜보고 섰다
- 시집, <허공, 하늘과 바다 사이>(모던포엠, 2021)
'사랑과 평화의 기도'가 되어 지금도 은은히 울리고 있는 종소리가 그의 시편을 읽는 모든 이들의 귀에 오래 오래 들려지길 응원합니다. - 석전(碩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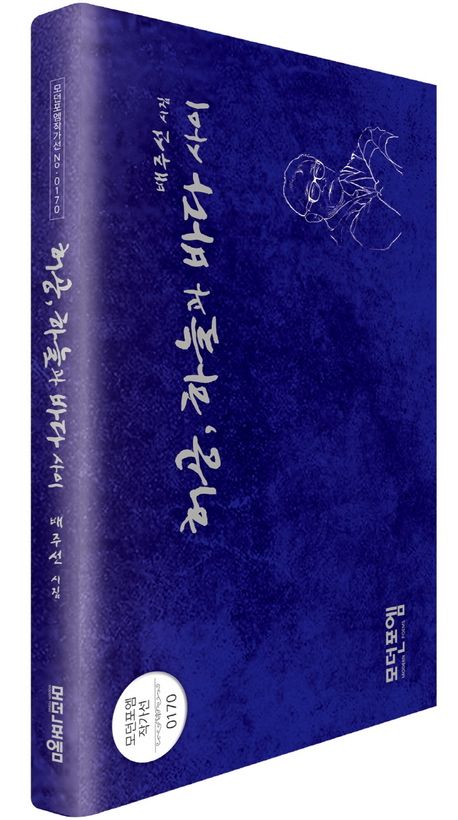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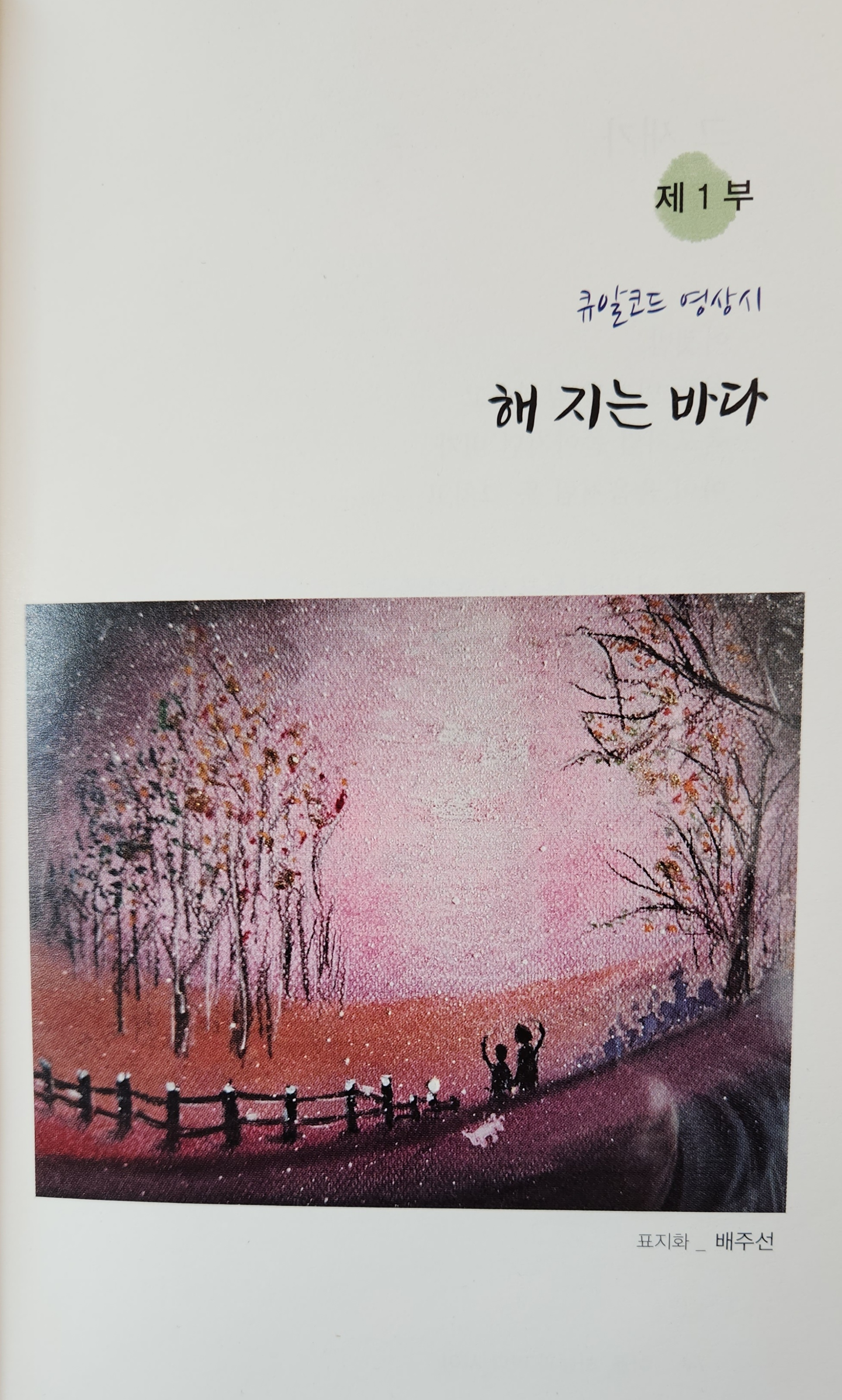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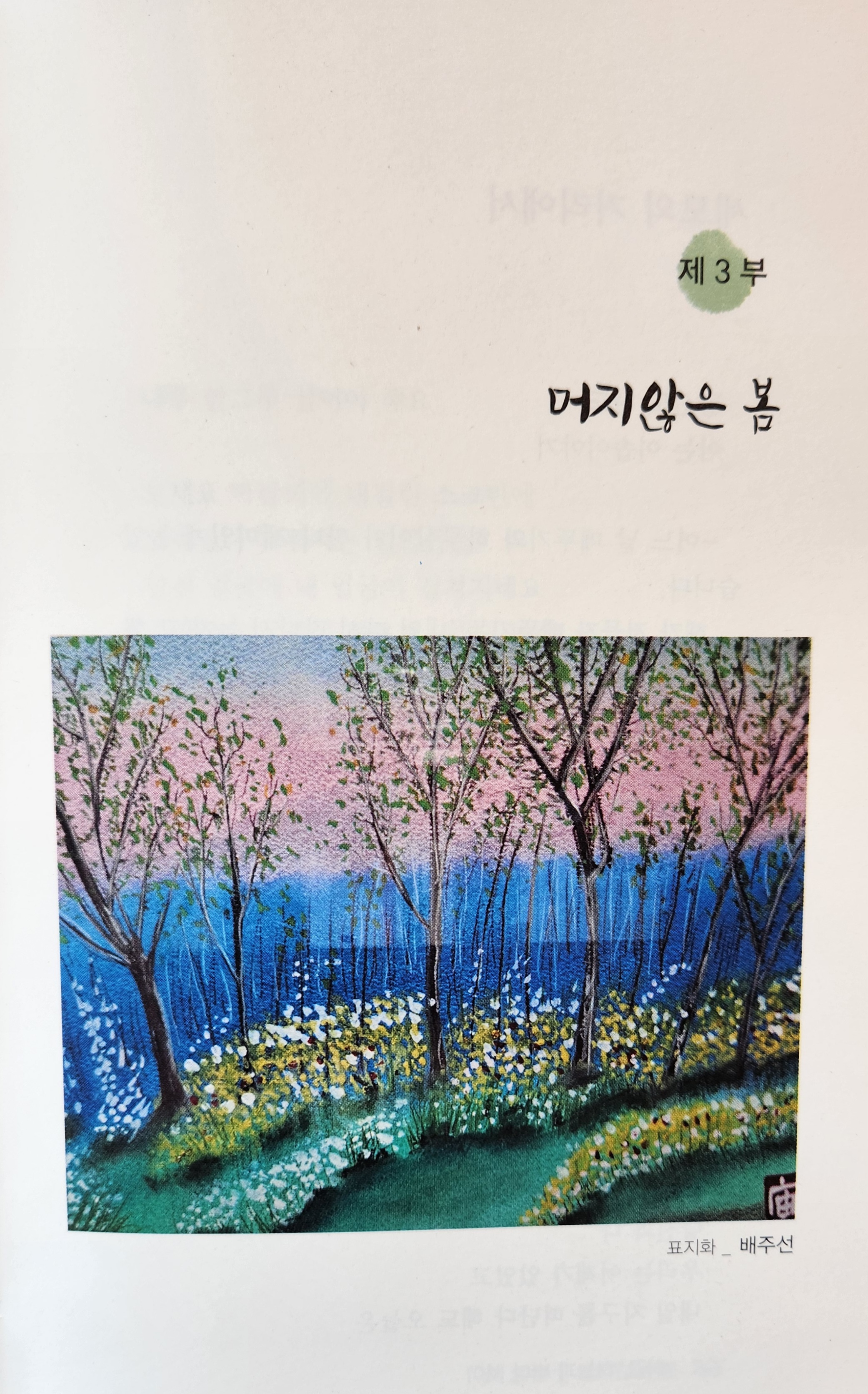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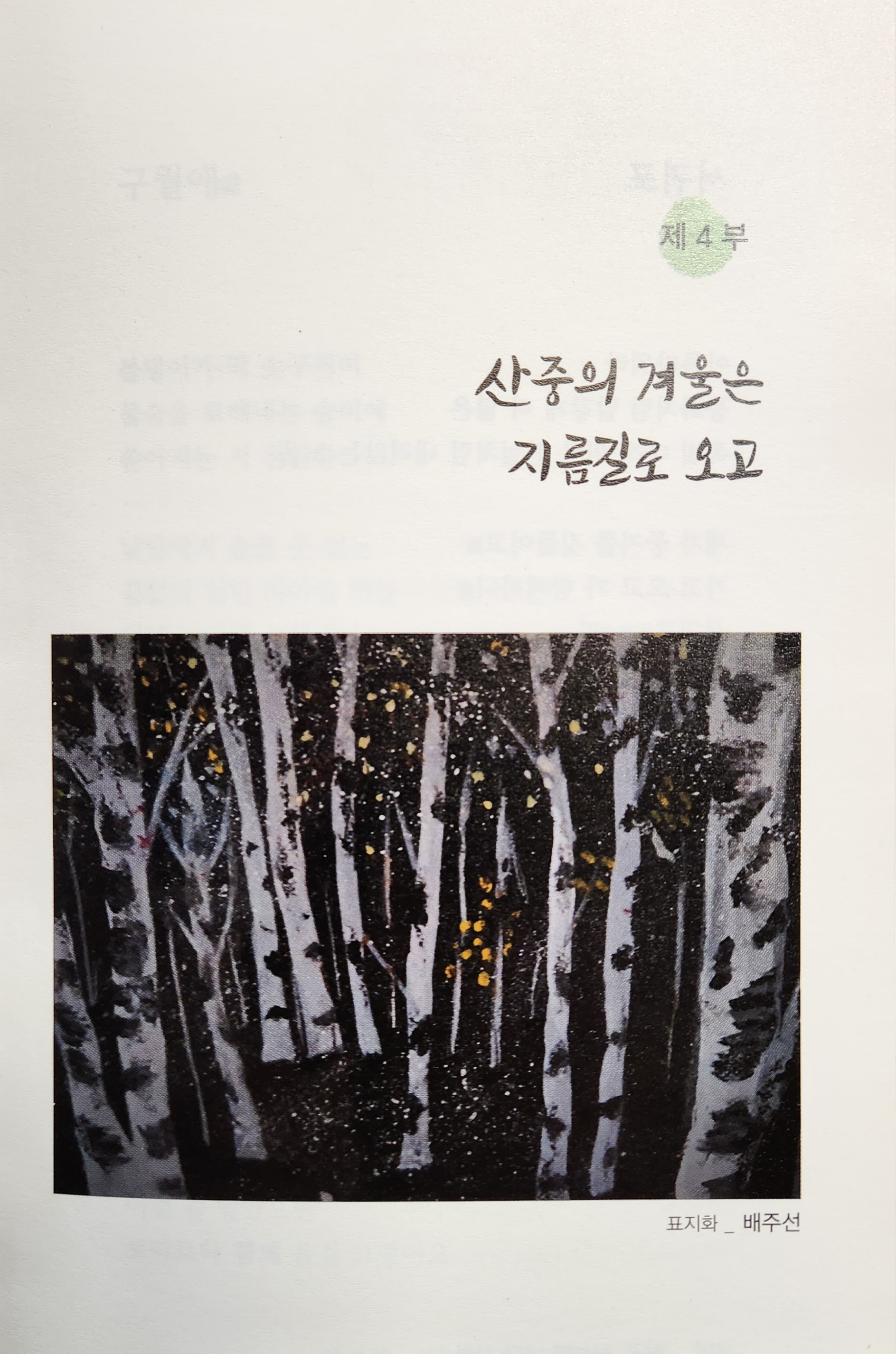
'아침에 읽는 한 편의 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안부 전화 - 나태주 (0) | 2023.02.22 |
|---|---|
| 카살스 - 진은영 (0) | 2023.02.15 |
| 어느 늦은 저녁 나는 - 한강 (0) | 2023.02.01 |
| 불멸(천개의 바람이 되어) - 클레어 하너 (0) | 2023.01.25 |
| 겨울밤 - 이재무 (0) | 2023.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