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부러진 못
- 전남진
정신 바짝 차리며 살라고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지면서
못은 그만 수직의 힘을 버린다
왜 딴생각하며 살았냐고
원망하듯 못이 구부러진다
나는 어디쯤에서 구부러졌을까
살아보자고 세상에 박히다
다들 어디쯤에서 구부러졌을까
망치를 돌려 구부러진 못을 편다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고
일어서지 않으려 고개를 들지 않는 못
아니다, 아니다, 그래도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정신을 놓을 때도 있지 않겠냐고
겨우 일으켜 세운 못를 다시 내려친다
그래, 삶은 잘못 때린 불꽃처럼
짧구나, 너무 짧구나
가까스로 세상을 붙들고
잘못 때리면 아직도 불꽃을 토해낼 것 같은
구부러져 녹슬어가는 못
- 시집 <월요일은 슬프다>(문학동네, 2021.6)
* 감상 : 전남진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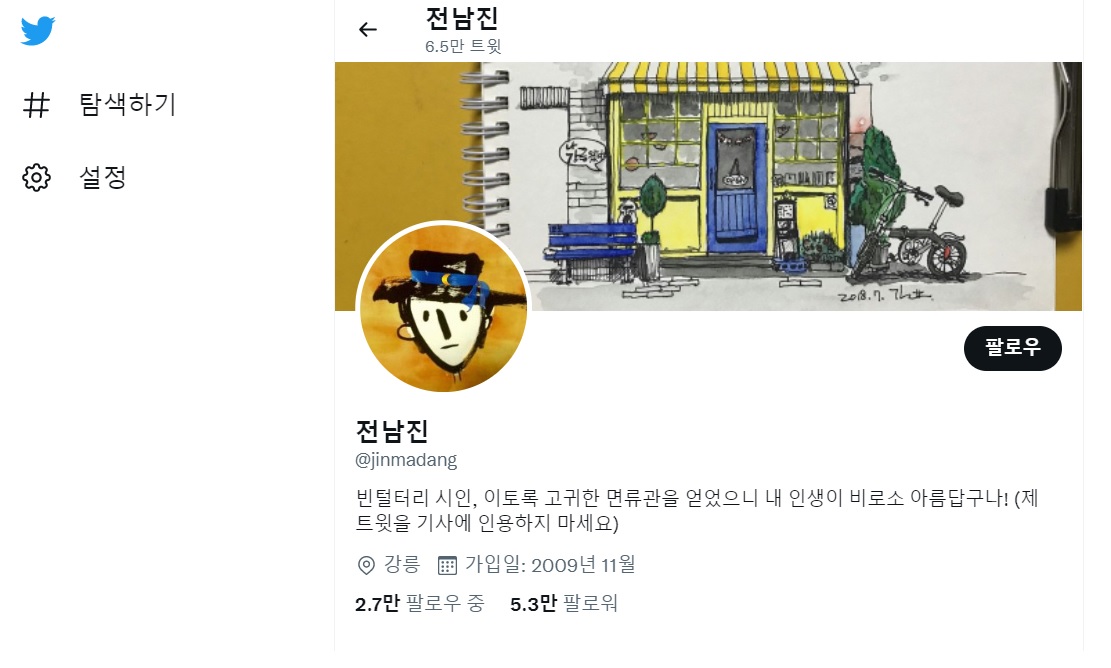
1966년 경북 칠곡군 기산면 가시막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한일건설 홍보팀에 재직하던 1999년 <문학동네> 신인 문학상에 ‘나는 궁금하다’는 시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왔습니다. 그 후 12 년간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시골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강원도 강릉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현재는 강릉의 막다른 골목길 안에 있는 북 카페 <모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을 위해 바리스타로서 <모모의 외출>이라는 작은 카페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집으로 <나는 궁금하다>(문학동네, 2002), <월요일은 슬프다>(문학동네, 2021) 등이 있고, 산문집 <어느 시인의 흙집일기>(랜덤하우스코리아, 2003), <아빠랑 시골 가서 살래>(좋은생각, 2005)가 있습니다.
전남진 시인은 지난 해 그의 시집 개정판이 출판되면서 ‘역주행 시인’으로 세간에 알려진 시인입니다. 2002년 10월, <문학동네>에서 낸 첫 시집 <나는 궁금하다>에서 시 몇 편을 덜어내고 첫 시집 이후의 미 발표작을 더해 <월요일은 슬프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내놓았습니다. 첫 시집과는 달리 개정판 시집이 발간되자마자 1쇄가 다 팔리고 2쇄를 두 달 만에 찍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그의 시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니 사람들이 그제야 그의 진가를 알아봤다고나 할까요.
오늘 감상하는 시는 못을 박다가 잘못 내리쳐 그만 구부러져버린 못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내비치는 시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만 구부러져버린 못을 보면서 ‘나는 어디쯤에서 구부러졌을까’라고 반문하는 표현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그 뿐 아니라 한 손에 망치를 들고 서 있는 시적 화자에게 구부러진 못이 항의하듯 반문하는 질문이 매섭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왜 딴 생각하며 살았냐고 / 원망하듯 못이 구부러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호된 질문은 기실 망치를 들고 서 있는 지금의 시인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저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보자고 세상에 박히’며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들 어디쯤에서 구부러졌을까’ 시인은 심각한 화두를 던집니다.
몇 번이고 ‘여기서 그만 두고 싶다고 / 일어서지 않으려 고개를 들지 않는 못’처럼 수직의 힘을 잃어버린 자신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도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 살다 보면 / 한 번쯤은 정신을 놓을 때도 있지 않겠냐고 / 겨우 일으켜 세운 못를 다시 내려친’적이 여러 번. 마음 같아선 ‘아직도 불꽃을 토해낼 것 같은’ 심정이지만 내 앞에 놓여 있는 삶은 ‘잘못 때린 불꽃처럼 / 짧구나, 너무 짧구나’ 한탄이 나옵니다. ‘가까스로 세상을 붙들고’ 일어서보지만 마음만 앞서는 그저 ‘구부러져 녹슬어가는 못’일 뿐입니다.
평론가들은 시인을 ‘시선을 끄는 경쾌하고 거침없는 화법’으로 ‘자신만의 개성적인 공간을 만드는 데 성공하고 있는 시인’으로 평하고 있습니다. 첫 시집을 내고, 19년이 지난 후 그 시집의 개정판 하나만 달랑 낸 시인으로서 세상을 항해서 할 말도 참 많을 듯한데, 그는 한적한 시골 도시에서 커피를 볶으며 사람들과 소통하며 구부러져 녹슬어가는 못처럼 여전히 ‘잘못 때리면 아직도 불꽃을 토해낼 것 같은’ 마음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서울 강남의 뱅뱅 사거리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숨 가쁘게 살아가는 홍보실 직원으로 근무할 때 썼던 그의 시 하나를 더 감상하면서 오늘 시 감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매일 오가는 출근길과 퇴근길에 맞닥뜨리는 풍경 속에서 당시 시인에게는 궁금한 게 참 많았던 듯합니다. 그리고 그런 궁금증들이 결국, 그를 지금 어느 도시의 막다른 골목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모’가 되어 세상과 소통하는 ‘삶의 시인’이 되게 한 건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 - 석전(碩田)
나는 궁금하다
- 전남진
아크릴 상자 칸칸 애벌레처럼 채워진 넥타이를 하루 종일 만지작거리는 아주머니가 하루에 몇 개를 파는지. 안흥 찐빵 수레를 덜덜 밀고 출근길 찾아다니는 어머니 나이쯤 아주머니의 찐빵을 가족들이 저녁 대신 먹는 것은 아닌지.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우는 약 파는 전철 아저씨 하루 종일 묻은 때도 그 약으로 지워지는지. 자리싸움 밀려 아파트 뒷길로 등불 내다 건 구이 아저씨의 꼬치가 식기 전에 팔리는지. 둥글게 떼어낸 호떡 반죽을 꾹꾹 누르는 기름종이 같은 손이 겨울날 장갑 없이도 왜 트지 않는지. 뒤집히고 구르고 또 뒤집히며 사각상자 안에서 몸부림 치는 장난감 자동차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아저씨가 자기 삶이 저렇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넥타이와 찐빵이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오를 듯한 빈 지갑 같은 오후가 어제도, 오늘도......왜 한 번도 바뀌는 일이 없는지. 장사를 마치고 떠난 빈자리로 날아드는 도시의 희미한 별들이 내일 팔릴 장난감이고 호떡이고 얼룩 지우는 약은 아닌지.
- 시집 <나는 궁금하다>(문학동네,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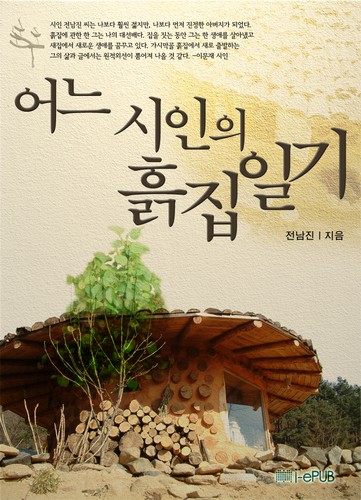


'아침에 읽는 한 편의 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의 게르 - 최금녀 (0) | 2022.05.11 |
|---|---|
| 우리 모두 농담처럼 새고 있다는 것을 - 이성임 (0) | 2022.05.04 |
| 여기서 더 머물고 싶다 - 황지우 (0) | 2022.04.20 |
| 벚꽃 - 이윤학 (0) | 2022.04.13 |
| 그대 앞에 봄이 있다 - 김종해 (0) | 2022.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