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낭패
- 도광의
오랜만에 고향에 갔다
간밤에 마신 술 탓에
새순 나오는 싸리 울타리에
그만 누런 가래 뱉어놓고 말았다
늦은 귀향길 안쓰런 마음 더해가는
고향 앞에서 나는 또 한 번 실수에
무안해 하는데
때마침 철 늦은 눈이
내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고 있었다
- 시집 <그리운 남풍>(문학동네, 2003)
* 감상 : 도광의(都光義) 시인. 호는 목우(木雨).

1941년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리 171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1967년 마산고등학교(1967~1968)를 시작으로, 창신고(1969~1971), 대구 대건고(1971~1996), 효성여고(1997~1999) 등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1999년 교직에서 은퇴하였습니다.
1966년 그가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일 때, 대구 매일신문 신춘 문예에 100행이 넘는 긴 장편 시 ‘비 젖은 홀스타인’이 당선되었으며, 1978년 <현대문학>에 ‘갑골길’, ‘눈 오지 않는 겨울’ 등 6편의 시가 추천 완료되어 시인으로 등단하였습니다. 시집으로 <갑골길>(흐름사, 1983), <그리운 남풍>(문학동네, 2003), <하양의 강물>(만인사, 2012), <무학산을 보며>(개미, 2020), <합포만 연가>(개미, 2022), <고향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개미, 2023) 등이 있습니다. 대구문학상(1982), 한국예총 예술문화상(2003), 소월문학상(2014), 한국문학상(2020), 창릉문학상(2021)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주로 남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니, 그의 제자들은 남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시인 안도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스승이 도광의 선생님’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그는 문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구 대건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을 때 그가 가르친 제자 중에는 안도현 시인을 비롯하여 홍승우 시인, 서정윤 시인, 조성순 시인, 이정하 시인, 권태현 시인, 시인이자 소설가인 김완준, 그리고 소설가 겸 문학평론가 박덕규, 하응백, 조선일보 기자 출신 장편 소설가 최보식, 번역가 이경식 등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도광의 사단이라고나 할까요.
두주불사, 과음 형이었던 그는 수업 시간에 숙취로 인해 주전자에 있는 물을 자주 들이키는 바람에 학생들 사이에서 ‘금붕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특히, 교과 진도와는 상관없이 수업을 진행했는데 ‘참고서 보면 다 나오는데 뭣하러 따분하게 설명하나. 집에 가서 읽어봐라.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한 후, 수업 시간 내내 릴케, 보들레르, 엘리엇, 워즈워드, 두보를 비롯한 동서양의 명시들, 그리고 서정주, 박목월, 김춘수의 시가 술술 그의 입에서 낭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작품을 외우라고 말하는 대신 시인 자신이 좋은 시를 암송하였는데, 당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가슴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도 약 200수 정도의 시를 외우고 있을 정도여서 어디에서든 시끄러운 좌중을 일시에 압도하고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시 낭송을 경청하게 할 정도로 그의 시 낭송하는 실력은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출간된 그의 가장 최근 시집 <고향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에는 시인이 태어나고 자란 경산 와촌면 동강리에서 경험한 유년 시절의 고향 산천을 노래한 시들로 가득합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고향에 갈 때마다 마을 앞을 흐르는 강물은 또랑물이 되었고, 발가벗고 놀던 냇가의 우뚝 선 바위는 작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칡넝쿨 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계전동의 달음산은 200m도 안 되는 야트막한 야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옛 과수원도 없어지고 고향의 풍물은 다 사라졌지만, 고향은 언제나 도회지 삶에서 때 묻은 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고향에는 정겨운 마을 이름들이 아직도 기억 속에서 살아있고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미세한 숨결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까만 열매를 달고 거름 무더기 옆에서 자라는 까마중 같은 마을 사람들의 구수한 얼굴과 살냄새, 무한한 순박함이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라고. 시인은 그런 고향은 자신에게 지난날의 잃어버린 것들을 고스란히 되찾게 해주는 존재라며 그 애틋한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 시집의 제목을 역설적으로 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폭염(暴炎) 속에서 고향 뒷산에 있는 선영(先塋)의 벌초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문득 도광의 시인의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이 시가 생각이 난 건지 그 이유는 뚜렷이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시인이 고향을 찾을 때마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작품의 원천으로서의 고향이긴 하지만, 자꾸만 퇴색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느끼게 되는 것과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각자의 이해타산 앞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닌, 고향 마을의 현안(懸案)을 논의하다가 황망히 떠나온 탓이겠지요.
아마 시인도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반가운 마음에 친구들과 어울려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나 봅니다. 그리고 옛집으로 돌아오다가 ‘간밤에 마신 술 탓에 / 새순 나오는 싸리 울타리에 / 그만 누런 가래 뱉어놓고 말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 들키지도 않았지만, 시인 스스로 그게 못내 안쓰럽고 신경이 쓰였는지 무안해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철 늦은 눈이 / 내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고 있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유행가 가삿말처럼 그저 끈을 놓아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고향’인가 봅니다.
도광의 시인의 대표 시로 알려진 ‘갑골길’을 감상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인이 마산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이웃에 있는 함안여고에는 한하균 선생이 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또 문학의 길을 걷는 동료로 친하게 교류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 속에서 등장하는 ‘한 선생’은 지난 2018년, 향년 87세의 나이로 작고한 연극인 한하균 선생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갑골(甲骨)길
- 도광의
경남 함안여고(咸安女高)
백양(白楊)나무 교정에는
뼈 모양의
하얀 갑골(甲骨)길이 보인다.
함안 조(趙)씨, 순흥 안(安)씨, 재령 이(李)씨
다투어 살고 있는 갑골리(甲骨里)에는
바람 많은 백양(白楊)나무 생애로
노총각 한 선생(韓先生)이 살아왔다.
산 까마귀 울음 골짝에 잦아
외길 진
뙈기밭 능선을 이웃하면
함안 조(趙)씨, 순흥 안(安)씨 사당(祠堂)들이
기왓골에 창연하다.
명절날 둑길 위로
분홍 치맛자락이
소 수레바퀴의 햇살에 실려 가면
닷새 만에 서는
우시장(牛市場) 읍내에는
건장한 중년(中年)들로 파시(波市)가 선다.
어쩌다가 높은 둑길 위로
청람 빛 가을이 펼쳐지면
청동색 강이 오히려 외롭다.
우마차 바퀴에 옛날이 실려 가면
함안여고
백양나무 교정에서
사십 대 노총각 한 선생(韓先生)은
유년(幼年)의 여선생(女先生)을 생각이라도 하는 걸까.
벼 익은 하늘의
먼 황소울음에 젖다가도
삼천포 앞바다의 편(片) 구름을 바라본다.
- 시집 <갑골길>(흐름사, 1983)
도광의 시인 스스로, 자신이 지방에서 활동하는 시인이 아니라면 신경림의 ‘농무’보다 더 좋은 시라고 자찬(自讚)했던 시이기도 합니다. 마산고등학교 3층 도서관에서 바다를 향해 그윽한 눈으로 서 있는 멋쟁이 도 시인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 멋진 시입니다. 하늘이 높아지고, 수로의 물 빛이 더 깊어지며 벼가 막 익기 시작하는 이즈음에 읽기에 안성맞춤인 듯합니다.
‘유명한 시인들의 스승이면서, 대구의 영원한 로맨티스트로 불리는 도광의 시인’이 나이에 구애됨 없이 남은 인생, 보석 같은 좋은 시들을 삶 속에서 계속 건져 올리길 응원합니다. - 석전(碩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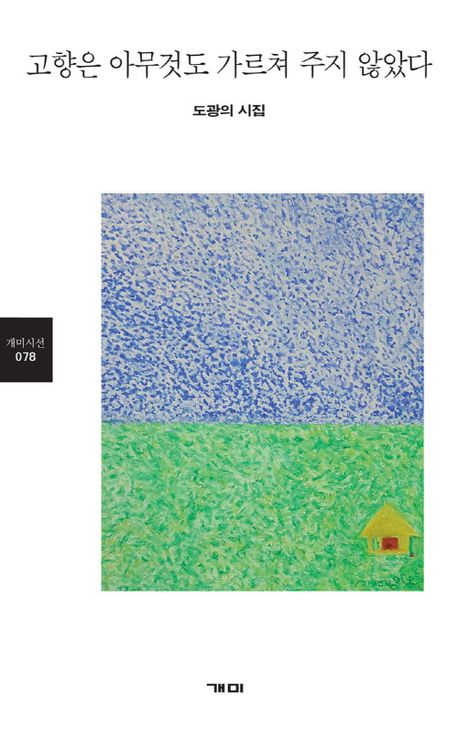
'아침에 읽는 한 편의 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 연제진 (0) | 2024.09.11 |
|---|---|
| 구월이 오면 - 안도현 (5) | 2024.09.04 |
| 처서(處暑) / 풀벌레 소리 - 허형만 (0) | 2024.08.21 |
| 여행의 목적 / 낮 동안의 일 - 남길순 (0) | 2024.08.14 |
| 여름 끝물 / 자라 - 문성해 (0) | 2024.08.07 |